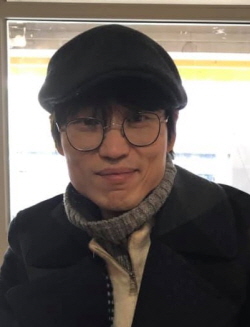
1월 25일 오전 10시, 서울에 일정이 있어 용산행 기차를 탔다.
열차는 서울을 향해 미세한 쇳소리와 바람소리를 내며 빠르게 달렸다. 갑자기 머릿속에 ‘용산’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지난 1월 20일은 용산참사 10주기가 되던 날이었다. 용산참사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나는 ‘웅’하는 기차 소리에 당시 망루가 화염에 휩싸이기 불과 몇 분 전의 상황이 그려졌다.
숨이 턱 하고 막혀오기 시작했다. 뉴스와 기사로 송출되던 장면과 김일란 감독의 <두개의 문>과 <공동정범> 두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알게 된 게 전부지만 머릿속에 빙빙 도는 당시의 모습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개발은 사람의 흔적을 온통 지워버린다. 오래된 공간에 담긴 이야기도 한순간일 뿐이다. 하룻밤이 지나면 동네 친구들과 스티로폼과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놀던 연못이 시멘트 바닥으로 바뀌었고, 아름드리나무에 매달린 그네는 사라지고 밑동만 덩그러니 남았다.
나의 기억도 사라지고 잊혀진다는 것에 익숙해졌다. 개발은 자본의 어두운 민낯과 함께 이루어진다. 개발에 의해 살아온 공간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난다. 그렇다고 이 상황들이 평화롭지도 않다. 권위적이고 폭력적이며 일방적이다.
용산참사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목도했다.
당시 용산 철거민들을 진압했던 지휘관 김석기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명박대통령 재임 당시 오사카 총영사,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뒤 국회의원까지 당선되었다. 국가는 이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에게 물었다. 당시 대법원의 주심은 양승태 대법관이었다. 양승태는 이 판결 이후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불과 몇 년 전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이게 나라냐’며 전 국민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일어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많은 상처들을 안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제주의 제2공항 건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스물넷의 비정규직 청년,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다 죽음을 선택한 모녀가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며칠 전 독립영화관이 자리한 건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어쩌면 우리도 이 공간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른다.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건물주가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공간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얼굴이 한 명 한 명 떠올랐다. 모두가 하나의 소중한 기억이었다. 잊혀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기억들도 어쩌면 내 의지대로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히 스쳐지나갈 법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 <얼굴들>이라는 독립영화 한편을 보려 한다. 기억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해 작은 몸부림을 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