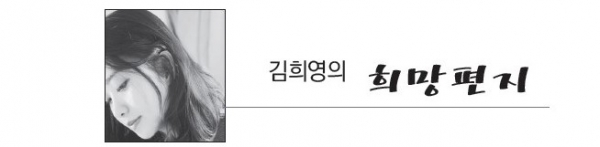
[목포시민신문] 익숙했던 모든 시간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랑에 회의를 느꼈다.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신했는데, 사실 나는 당신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 비친 당신의 눈빛이 떠오른다. 그 눈빛을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울렁거린다. 화장실 변기에 얼굴을 박고 속을 게워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얼굴을 온통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아도, 마음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다.
긴 밤 중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걷히고 봄이 오길 바랐던 마음은 늘 촉박하기만 했다. 차가운 겨울 달이 하루빨리 차오르길 바랐다. 내일이면 나아지려나. 어지러운 심정을 찬 손으로 누르면서 애써 웃었다. 당신과의 추억이 서린 물건들을 태우면서 또 한 번 울음을 토했다. 일렁이는 불길 속 우리의 추억이 한 줌의 영혼으로 타오르는 것만 같았다. 이로써 모든 것들이 소멸하게 되었다고, 당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애써 위안했다.
그러나 이별은 머리로 이해하고 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다. 모든 게 멀어졌다고 해서, 마음마저 멀어질 수는 없었다. 슬픔의 진통은 눈물을 잉태했고 그 숭고로 빚어진 결단에 나는 애착을 가졌다. 실물하는 모든 것들이 새까맣게 타 없어졌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나의 영혼만 갇혔다. 헤어나오지 못할 가시넝쿨 속에서 아프다고 몸부림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당신에게서 벗어날 방법을 찾다가 당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질긴 집착도 시작되었다. 꺼내 보고 싶지 않았던 부서진 자존심을 접착제로 힘겹게 붙였다. 작은 입김에도 힘없이 으스러져 버리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했다. 지난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소나기 같은 질투와 증오를 마음 곁에 후드득 쏟아냈다.
제발 떠나줘. 부탁이야.
당신이 애걸하며 두 손을 모아도 이미 내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다. 이걸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도, 증오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했다. 어느 한때 당신을 사랑했다가도, 또 어느 한때는 당신이 죽도록 미웠다. 왜 내 곁을 떠났느냔 원성과 그런 당신을 이해하는 상냥함과 뼈가 시리도록 쓸쓸한 외로움이 온몸과 마음을 휘감았다. 처참하게 망가져 간 나를 뒤로한 채, 당신이 행복한 듯 웃고 있으면 왠지 모를 뜨거운 불길이 목구멍까지 타올랐다. 나는 그 불같은 말을 혀 밑에 감춰두고는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았다.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돼? 부탁이야.

서로의 양보 없는 부탁이 벽을 만들고, 맞물리지 않는 대화는 의미 없는 시간만 흘려보냈다. 사랑은 한쪽이 애가 탄다고 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이 끝자락 사랑을 놓지 못하겠다. 헤어지잔 말 한마디에 지난날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까 봐, 내 인생의 일부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썩게 될까 봐 두려웠다. 나는 이 모든 사랑이 유의미했으면 했다. 첫사랑도, 첫 연애도, 결혼도.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정말, 힘들 것 같다.
2021.09.09 목요일 「희망차게 영화롭게」


